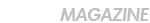청파동에서, 나로부터 바깥으로 채색해 나간 들꽃 같은 노래들
정밀아의 노래에서는 훈풍이 불어온다. 케이팝의 주체 못할 뜨거움도, 시티팝의 쿨한 차가움도 다다르지 못할 미지근한 온도와 낮은 풍량의 바람. 그러나 그 조용하고 느린 공기의 흐름이 끝내 꽃을 피우고 씨앗을 날린다.
정밀아의 3집 ‘청파소나타’가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고 영예인 ‘올해의 음반’을 수상했다. 9년 전 5만 원 주고 샀다는 중고 나일론 기타 한 대를 중심으로 나지막하게 펼쳐내는 정밀아의 모던 포크는 볼수록 빨려드는 어두운 정밀화처럼 내밀하게 회화적이다. 밥 딜런, 존 바에즈, 한대수가 그러했던 포크의 정수를 오랜만에 돌아보게 만든다. 자신을 응시하고 사회를 바라보며 통기타를 향해 손가락의 붓을 든다. 한 음, 한 음을 채색해간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창가에서, 길가에서 피어난 들꽃 같은 노래들에 대해, 그리고 음악가 정밀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 임희윤 ㅣ 사진: 스튜디오 빌리빈 (지운)ㅣ 에디터: 허소연
Q.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를 졸업하셨죠. 미술을 하다가 뒤늦게 음악가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아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요.
어려서부터 교회 성가대 피아노 반주도 하고, 고교 때는 라디오에서 재즈라는 장르를 접하고 뭣도 모르고 빠져들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밴드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졸업 무렵 남은 멤버들과 ‘물체 주머니’란 팀을 만들어 홍대 앞에서 공연도 했고요. 그렇지만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도 하고 미술교실도 운영하면서 지냈어요. 2012년 초여름에 라이브 클럽의 ‘오픈 마이크’ 행사를 알게 돼 기타를 서너 달 독학해 오른 게 솔로 데뷔 무대가 됐네요.
Q. 2월 말에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반을 수상하셨어요. 상복이 많은 편이신가요? 수상 소감을 다시 한번 여쭤도 될지요.
학창시절에 이런저런 대회에 나가 미술 관련된 상은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은 아마 평생 가장 큰 상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만큼 많이, 자세히 들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노래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 입체적으로 들여다봐주신 분들이 많아서 고마워요. 제 노래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론가 계속 흘러가고 있겠죠. 무엇이든 좋은 작용을 일으켰으면, 그래서 노래가 오래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음악가들도 음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Q. ‘청파소나타’로 큰 상을 받았으니 청파동으로 이사하시길 잘했네요. 청파동은 정밀아 씨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연희동에 살다가 2019년 가을에 청파동으로 왔어요. 너무 정확한 이유가 있죠. 지방 공연을 다니다보면 새벽에 서울역에서 택시 잡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가까운 청파동에 자리 잡게 됐죠. 서울역 일대를 얼핏 보면 고층빌딩의 스카이라인이 보이지만 이쪽은 지하에 봉제공장이 있는 빌라가 많고 가파른 계단도 많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약속도, 공연도 거의 없어지면서 동네 산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청파소나타’를 구상하게 됐죠. 나의 ‘오늘’을 기록할 수 있었던 재미난 곳 이라 하겠습니다.

Q. 새소리와 광장의 소리 같은 생활 소음을 포크와 접목한 것이 인상적이에요. 음반에 들어있는 소음들은 실제로 청파동에서 직접 채록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남산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있으면 매일 새소리가 들려요. 어느 봄날에 그 창가에 앉아 마이크로 소리를 녹음했어요. 그걸 첫 곡 ‘서시’에 담았죠. ‘광장’에는 서울역, 그리고 산책하러 나간 광화문에서 채록한 소리들을 썼어요. 청파동은 청각적으로 흥미로운 곳이기도 해요.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서 일정 시간이 되면 여행자들이 공항철도에서 내려 캐리어를 끌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죠. 코로나19 이후 잠잠해지기는 했지만요.
Q. ‘오래된 동네’ ‘광장’ ‘환란일기’ 같은 곡에서는 사회적 메시지, 약자에 대한 귀 기울임, 개발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간절히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지요.
저는 활동가나 정치가가 아니어서 사회현상에 대해 어떤 또렷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지금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에 둘러싸여 살아가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고민들을 담았어요. 나란 존재는 결국 어떻게든 외부와 얽혀있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잖아요. 그래서 내 사유의 깊이와 폭을 내가 사는 시대와 공간에 일어나는 일까지 확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주위를 쭉 훑어봤더니 이런 세상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이런 풍경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담았어요. 다만(‘조금 더 나아가’), 제 노래를 듣고 다양한 이야기가 생겨난다면 재밌겠네요.
Q. 힘을 쭉 빼고 부르는 특유의 창법이 정밀아 씨의 음악세계를 되레 더욱 단단하게 완성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창법 말이에요.
맞아요. 제 노래가 가사도 많고 해서 곡의 분위기에도 어울리면서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서울역에서 출발’은 실제로 아침에 목이 잠긴 상태에서 녹음했어요. 일부러 그날 아침에 말도 거의 안 하고 스튜디오에서 인사만 한 뒤 목이 잠긴 느낌으로 불렀어요. 전체적으로는 잔잔하게 들리겠지만, 눈치를 못 채실지 몰라도 그 안에서 드라마를 넣으려 애썼죠.

Q. ‘오래된 동네’에서는 옛 투쟁가의 형식, 리듬, 선율이 오버랩 돼요. 어떤 의도로 작곡과 편곡을 하셨는지요.
개발이란 불가피한 일일 테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놓치는 것, 사려 깊지 못한 일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노래하는 사람이면(혹은 창작자라면) 그런 것들을 담고 기록해두는 일을 했으면 했어요. 동네에 걸린 현수막과 빩간 글씨에서 투쟁가 리듬이 떠올랐어요. 왜 사람들은 하필 그런 말을 하기 위해 그런 노래를 그런 리듬에 그런 식으로 불렀을까 하는 생각을 음악가로서 하게 됐어요. ‘단순한 멜로디, 다같이 크게 부를 수 있는 형식…. 그게 아니면 투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형식을 환기시킬 요소를 가져왔지만 저의 노래이므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러낸 거예요.
Q. 앨범 속지에 직접 그리신 그림도 담았네요. 정밀아 씨의 내면에서 미술과 음악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순수미술을 공부하고 미술 작업을 하면서 사회적 현상이나 사물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창작으로 이어가는 방식을 배웠어요. 음악을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번 공연까지 하고 쉬면서 그림 그려야지’ 하면 그림이 더 절실해지고,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으면 ‘기타 연습 하고 싶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하하.
*정밀아's 덕밍아웃
저는 무엇인가에 푹 빠지는 이른바 ‘덕’이 잘 되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제 주변을 잘 살펴보았더니 이것 한가지가 있더군요. 바로 식물(채소)기르기 입니다.
6,7년 전부터 매년 봄이 되면 저는 베란다나 창가에 화분을 정비하여 두고 씨를 뿌립니다. ‘농사’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실은 그냥 귀여운 화분 몇개일 뿐이면서, 겨울끝 무렵부터 ‘아, 올 봄에는 뭘 키우나?’ 라며 오만평 농사꾼이나 되는듯 설레고 진지해 집니다.
모종을 사서 키워가기도 하고, 씨앗을 불려 뿌리고 싹이 나는걸 매일 관찰 하기도 해요. 씨앗부터 시작할때는 대게 식물이 덜 건강 하기는 하지만, 모든 과정을 혼자 해보리라는 의욕-그래도 유기농 아니냐는 사실이지만 뭔가 허술한 자부심-지구의 푸르름에 3나노그램 정도 기여하는것 아니냐는 3톤의 망상-등이 저를 매해 농사로 이끕니다.
이제까지 상추, 깻잎, 청양고추, 당귀, 파(잘라먹고 무한키우기), 바질, 부추 등을 시도했었어요. 올해는 우선 청상추, 적상추, 깻잎을 시작했습니다. 씨앗도 엉성하게 뿌려서 떡잎부터 애매한 기운이 감돌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아, 내 소중한 풀떼기들 물줘야지!’ 라며 힘차게 몸을 일으킵니다.
넓은 밭에서 솜씨 좋은 분들이 키우는 것에 비해 크기도 작고 햇빛도 바람도 넉넉치 못하고 수확도 미약합니다. 그래도 서울 한복판에서 채소 몇뿌리 내 손으로 키워 먹는 보람, 매일의 초록을 지켜보는 즐거움, 본의 아니게 나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셀프노동. 너도 자라고 나도 같이 자라자 하는 화이팅, 이것만으로도 넘치게 즐겁습니다.
그러고보니 제가 제대로 풀떼기’덕’ 이군요.
- Instagram: jeongmilla click


*정밀아's 띵곡
1. 정밀아, <춥지 않은 겨울밤> (3집 수록곡)
움직이지 않는 겨울의 미지근한 공기에
아주 오래 걸어도 하루의 끝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밤에 이 노래를 썼다.
봄이 왔는데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들여다 보려고 부러 이 노래를 듣는다.

2. Bob Dylan, <I've Made Up My Mind to Give Myself to You>
'춥지 않은 겨울밤' 의 헤매는 마음이 이 곡을 듣는 순간 그냥 괜찮아졌다. 모르겠다. 다정한 노래도 아닌데,
그냥 더는 걷지 않아도 되겠네 했다.